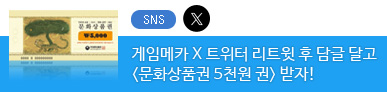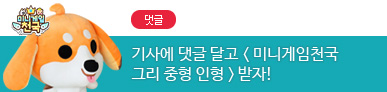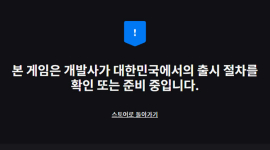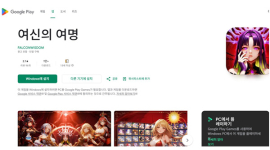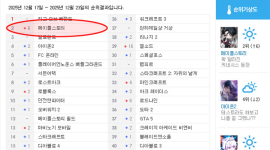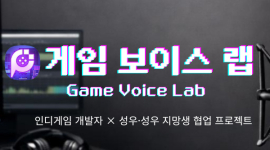[이구동성] 프리미어 마영전, 빨리하면 얼마나 이익이죠?
2009.12.04 18:46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메카만평

마영전, 일단 걱정하지는 말라는데
관련기사
[삼자대면] PC방에 좋은 자리 하나 잡아놔라~! 마비노기 영웅전‘마비노기 영웅전’이 16일 프리미어 오픈베타테스트에 들어갑니다. `프리미어 오픈`은 플레이 할 수 있는 장소가 PC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오픈베타테스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때 생성된 캐릭터와 플레이 정보는 정식 서비스 이후까지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오픈은 오픈인데 PC방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이 걸린 오픈베타테스트 때문에 ‘마비노기 영웅전(이하 마영전)’을 기다려 온 게이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장소도 장소이지만 오픈베타테스트를 위해 따로 지용을 지불 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PC방을 찾지 않은 유저들이 다른 유저들에게 뒤처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화륜강: 피씨방에선 돈을 내고 해야 하는데 만일 심한 버그와 잦은 튕김으로 제대로 게임을 못한다면 피씨방에 돈 퍼주는 식으로 밖에 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만일 오픈 후 연장 점검이라던가 잦은 튕김이 발생하게 되면 고스란히 유저에게 피해가 돌아오니.
cho017: 마영전 한 개 서버로 돌린다고 했던 걸로 압니다. 서버 여러 개로 안 나누고 한 개 서버에서 모든 유저들이 돌릴 수 있게. 오픈 늦어진 것도 그거 구현한다고 늦어진 것도 있는 걸로 알구요.
단일서버 노채널 방식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피방 선오픈이면 이미 게임 끝이죠. 신규서버 생성될 리도 없고 피방 안가는 사람들은 한 달씩이나 늦은 상태로 게임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으로 봐서 한 달이면 오베 시작할 때 컨텐츠들 거진 바닥 날텐데 말이죠.
일단 ‘마영전’의 서버는 한 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게임처럼 여러 개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개발진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서버는 최종 2~3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버 내 채널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왔다갔다 할 수 있죠.
넥슨은 프리미어 오픈베타테스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일단 마영전은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이 즐겁고, (PC방과의) 사업적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리미어 오픈을 즐긴 유저와 그렇지 못한 유저들의 격차에 대해서는 “프리미어 오픈 때는 에피소드3까지만 공개 되는데 그 정도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마영전` 프리미어 오픈베타테스트. 확실한 프리미엄이 될까요? 빨리하면 이득일 것 같은데, 빨리해봤자 별 것 없다 하니 헷갈립니다. 지켜보면 알겠지요.
태권도, 게임 제작은 호쾌하면 안 된다.
관련기사
한국대표브랜드 ‘태권도’, 온라인게임으로 개발된다태권도가 온라인 게임으로 개발됩니다. 엠게임과 국기원은 2일 ’태권도’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이 시대 최고의 문화 컨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 태권도의 위상을 확립하고 태권도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자 추진 되었’ 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말이기도 하고 ‘최고’, ‘대표’라는 수식어가 조금 낯간지럽습니다만, 잘해보겠다는데 굳이 태클을 걸기 어렵습니다.
두 주체는 자신 있게 ‘세계에서 통하는 태권도의 브랜드화’를 외쳤지만 유저들은 좀 걱정이 앞서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표상품 OOO를 브랜드화 한다.’며 힘차게 착수된 프로젝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gusamsa : 하는 것 말릴 수 없는 노릇이니, 이왕 한다면 확실하게 잘 만들길.
하늘시티 : 발차기 하나로 세계를 제패할 기세.
이번 태권도 문화 컨텐츠 개발은 대통령 직속 국가 브랜드위원회가 추진하는 ‘태권도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이 태권도의 온라인 게임화를 우려하는 것은 태권도의 가치를 낮게 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섣부른 시도로 고유의 문화가 훼손 될까 걱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태권도에 지워질 ‘명품’, ‘최고’, ‘대표’란 타이틀이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상품화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품은 항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어야 합니다. 문화 파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맞겠지만, 문화의 브랜드화 곧 상품화 프로젝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백 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게임 제작만큼은 태권도 발차기의 호쾌함을 닮지 않았으면 합니다.
SNS 화제
-
1
콜옵과 타이탄폴의 아버지 ‘빈스 잠펠라’ 교통사고로 별세

-
2
에픽스토어 '디스코 엘리시움' 무료배포, 한국은 제외

-
3
'공포 2.0'과 함께, 파스모포비아 2026년 정식 출시 예고

-
4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최대 ‘매출 3% 과징금’ 발의

-
5
일러스타 페스, 풍자성 1,000만 원 VIP 입장권 예고 화제

-
6
서든∙블아로 다진 내실, 넥슨게임즈 신작으로 비상 준비

-
7
한국 게임 30년 조명, '세이브 더 게임' 3부작 29일 방송

-
8
'무늬만 15세' 여신의 여명, 부적정 등급으로 삭제 조치

-
9
[순위분석] 키네시스 ‘복귀각’ 제대로 열었다, 메이플 2위

-
10
[오늘의 스팀] 첫 90% 할인 슬더스, 역대 최고 동접 기록

많이 본 뉴스
-
1
[겜ㅊㅊ] 스팀 겨울 축제, 역대 할인율 경신한 ‘갓겜’ 7선

-
2
에픽스토어 '디스코 엘리시움' 무료배포, 한국은 제외

-
3
25일 단 하루, 칼리스토 프로토콜 에픽 무료 배포

-
4
[오늘의 스팀] 첫 90% 할인 슬더스, 역대 최고 동접 기록

-
5
마동석 주인공인 갱 오브 드래곤, 신규 스크린샷 공개

-
6
서든∙블아로 다진 내실, 넥슨게임즈 신작으로 비상 준비

-
7
콜옵과 타이탄폴의 아버지 ‘빈스 잠펠라’ 교통사고로 별세

-
8
국내 출시 초읽기, 밸브 하드웨어 전파 인증 완료

-
9
일러스타 페스, 풍자성 1,000만 원 VIP 입장권 예고 화제

-
10
락스타 전 개발자 “도쿄 버전 GTA 나올 수도 있었다”